"정든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권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 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돌봄을 선호한다고 답한 호스피스 환자 5086명 중 8.3%만 실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비율은 2021년 14.0%, 2022년 13.2%, 2023년 10.6%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입법조사처는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기관 중심의 임종에서 ‘자택 임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임종은 의료비·간병비의 과중한 부담 뿐만 아니라 환자의 정서적 불안, 병상 부족 문제, 의료재정 등 돈이 많이 드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택 임종 활성화를 막는 요인으로 먼저 죽음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문화를 꼽을 수 있다. 환자가 '희망 임종 장소'를 얘기해도 가족에게 쉽게 공유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임종 돌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로 한정해서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부족해 지역별 격차가 크다. 자택 임종 이후 사망 확인부터 장례 절차까지 불편과 불이익이 크다. 이는 병원 외 임종을 선택하기 어렵게 한다. 자택에서 사망하면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어렵다. 사인 규명을 위한 검안의 및 경찰조사 등이 기다린다. 이 과정에서 유족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충격, 불편이 상당하다.
자택 임종 준비하는 가족들의 부담...누가 돌볼 것인가?
입법조사처는 자택 임종 활성화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부의 예산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택의료와 방문간호에서 임종 서비스 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택 임종을 준비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환자 본인은 자택 임종을 원하더라도 가족에겐 여러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 1~2주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직장인의 경우 임종돌봄 휴가,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과 소득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든 집에서 삶을 마감할 '권리'가 나에겐 있을까?
중년 부부들은 양가 부모님의 투병, 사망 등으로 인해 '죽음'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간병, 돌봄의 어려움도 실감한다. 겨우 한숨을 돌리면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정든 집에서 삶을 마감할 '권리'가 나에겐 있을까? 내가 자택 임종을 결정하면 가족들이 따라줄까? 그렇다면 임종기에 접어든 나를 돌볼 사람은? 간병인, 아내, 남편, 자녀, 친척...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자택 임종을 고집하는 나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움에 빠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쇠약해진 내가 자택 임종을 고수하긴 힘들 것이다. 가족이 나를 병원으로 옮기면 그만이다...
생을 마감하는 장소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시대..."자다가 편안하게 죽고 싶다"
나도 도로 상가 건물 한 곳에 자리한 요양원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젊었을 때부터 술, 담배를 좋아한 탓인지 고혈압, 당뇨병에 이어 뇌졸중(뇌경색)으로 투병 한지 오래다. 한 쪽 몸이 마비되고 눈도 잘 안 보인다. 가족들이 나를 간병하느라 고생했는데, 자택 임종까지 고집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권리'나 있을까?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괴롭혀선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낯선 요양시설보다는 정든 집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이런 사례에서처럼 자택 임종은 복잡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 국회,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이다. 생을 마감하는 장소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서글픈 시대다. 긴 투병 생활 없이 '자다가 편안하게 죽고 싶다'는 말이 유난히 가슴에 와 닿는 시기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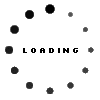
댓글 0